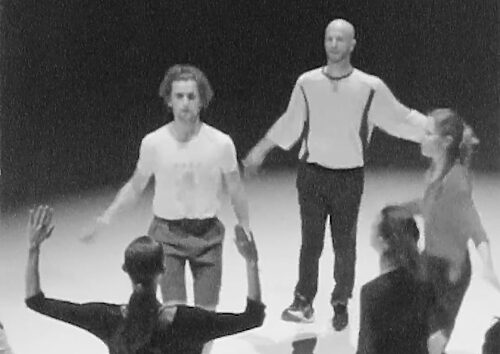건강과 아름다움을 고려한 라이프스타일, 가볍고 소박한 식사, 또는 동물 보호를 위해 육식을 반대하는 실천으로서 채식의 시대는 지났다. 지금 파인 다이닝계는 오직 새롭고 강렬한 맛에 집중하고 극도의 미각적 쾌락을 누리기 위해 주방에서 소와 돼지를 몰아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프랑스를 대표하는, 그리고 지구 상에서 미슐랭 의 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셰프 알랭 뒤카스(Alain Ducasse)는 그의 레스토랑에서 육류를 줄이고 채식주의 메뉴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백 년 동안 프랑스 정찬 요리의 주인공이었던 육류를 밀어내고 오직 채소로만 이루어진 메뉴가 전면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뉴스가 될 만한 사건이었다. 어떤 신문은 오트 퀴진 (Haute Cuisine)의 종 말이라고 호들갑을 떨었고, 점잖기로 유명한 영국 일간지 <가디언>마저 ‘오리와 송아지, 스테이크가 쫓겨났다’라고 표제를 뽑았다가 수정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본래 채식주의는 음식을 즐기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육류를 구할 수 없는 지역의 불가피한 선택이거나 생명을 대하는 종교적 입장에 가까웠다. 다른 생명의 희생을 거부하고 소박하게 곡물과 채소를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는 식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었다. 최근에는 동물 보호 같은 생태주의적 관점이 부각되고 육식 위주 식단에서 벗어나 건강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려는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채식은 하나의 세련된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많은 채식주의가 ‘육류를 부정하는 것’으로 스스로 를 정의한다. 그래서 때로는 채소 자체를 즐기지 못하고 건강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 ‘고기 아닌 것’을 먹는다. 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 굳이 콩으로 고기와 비슷한 무언가를 만들어 먹어야만 하는 채식주의라면 이것은 차라리 반(反) 육식주의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처음으로 채소를 파인 다이닝의 재료로 진지하게 접근한 사람은 파리의 레스토랑 아르페주(Arpege)의 셰프 알랭 파사르(Alain Passard)였다. 그는 2001년, 그의 레스토 랑에 미슐랭의 별을 3개나 가져다준 프랑스 전통 오리 요리와 송아지 췌장, 비둘기나 꿩과 같은 가금류, 양고기와 소고기가 포함된 요리를 메뉴에서 과감하게 빼버렸다. 그때부터 시작된 14가지 채식주의 테이스팅 메뉴에는 캐비아나 송로버섯 같은 고급 재료는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파와 당근, 무, 아스파라거스, 아티초크, 콩과 감자와 같은 평범한 재료만으로 240유로짜리 최고급 정찬을 채웠다.
사람들은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갈 때 평소 먹던 것과는 다른 것을 기대한다. 보통 서너 시간씩 이어지는 식사 내내 이런 평범한 재료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란 쉽지 않다. 식탁 위에는 거대한 서사도 시선을 빼앗는 장관도 없다. 오직 작은 접시 위에서 감각만으로 사람을 매혹해야 한다. 게다가 채소는 다루기 쉬운 재료도 아니다. 계절에 따라 수급이 달라지고 금방 시들기 때문에 보관이 어렵다. 일부 작물을 제외하면 감칠맛을 내기 힘들고 식물 특유의 쓴맛과 맵거나 신맛은 하나의 요리로 녹여내기 만만치 않다. 식감 또한 재료마다 천차만별이다. 마치 원색 물감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일처럼 쉽게 통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알랭 파사르는 실제로 원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 내듯 요리한다. 채소의 화려한 색감을 충분히 활용하고 신 맛과 쓴맛을 과감하게 조합한다. 프랑스의 전통에 얽매이 지 않고 다른 여러 나라의 요리법을 차용한 다채로운 음식 이 이어지니 지루할 틈이 없다. 붉은색의 비트가 밥 위에 올려져 참치 초밥처럼 나오고, 아랍풍 샐러드 타불레 (Taboule)에는 셰리로 만든 식초가 더해진다. 감자는 훈제 되어 구수한 맛을 내고 제철 소렐의 쓴맛은 통째로 잘 구 운 파의 단맛과 조화를 이룬다. 빨간색 무를 잘 졸여 타르 타르처럼 담아내고 알싸한 맛이 나는 호스래디시 크림을 올린다. 프렌치 코스 요리의 큰 틀은 남아 있지만 전채와 메인의 경계는 흐릿하다. 전통 요리의 외관은 채소라는 새 로운 질감으로 채워지고 예상치 못한 맛의 조합은 코스의 끝까지 긴장감을 이어간다. 그동안 조연의 자리를 지키던 채소들이 비로소 공평하게 주목을 받고 재료 하나하나가 세심하게 음미된다. 코스의 막바지에는 고기의 단백질과 지방에서 오는 물리적 양감 대신 다양한 맛의 조합을 차곡 차곡 쌓아 만들어낸 심리적 만족감이 남는다.
이렇게 채소를 하나의 독립적인 재료로서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채식주의는 파리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시도 되고 있다. 뉴욕의 팜-투-테이블(Farm-To-Table) 레스 토랑에서는 식당의 주방을 농장으로 확장해서 재료를 재 배하는 것에서부터 요리를 시작하기도 하고, 북유럽의 노르딕 퀴진(Nordic Cuisine)은 이끼와 바닷가의 해초를 채집해 그 지역의 자연을 갈무리하기도 한다. 어떤 방식의 채식주의든 이 음식들에는 셰프들의 세계관이 분명히 새겨져 있다. 얼어 있는 땅에서 싹을 틔우고 햇빛을 받아 잎을 내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식자재에 대한 깊은 고민과 존중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가장 오래된 채 식주의자였을 옛 승려들의 마음과도 닮아 있다.
- 에디터
- 황선우
- 포토그래퍼
- 박종원
- 글
- 신현호 (음식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