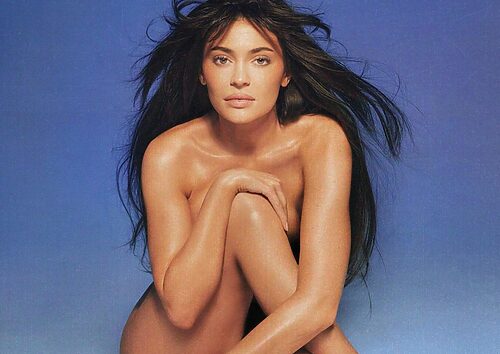지금까지 해외 미술 신에서 한국의 근대기는 ‘사이’로 여겨졌다. 조선시대 이전 전통미술과 현대미술 사이에서 ‘공백’으로만 남았던 이 시기. 9월 11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미국 LA카운티뮤지엄(LACMA)과 국립현대미술관의 공동 주최로 열리는 전시 <사이의 공간: 한국미술의 근대(The Space Between: The Modern in Korean Art)>는 베일에 감춰져 있던 한국 근현대 시기 미술을 집중 조명한다. 유례없는 격동기를 보낸 한반도, 그리하여 가장 역동성을 띠며 살아남은 예술품이 LACMA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올 초 영국의 미술 전문지 <아트 뉴스페이퍼>는 ‘2022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전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이를 다시 CNN이 보도했다. 기사에선 올해 주목해야 하는 대형 전시 총 10편을 소개했다. 테이트모던에서 열리는 폴 세잔의 회고전 <세잔>, 헤이그 미술관에서 몬드리안 탄생 15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전시 <피트 몬드리안>, 베니스 비엔날레, 카셀 도큐멘타 등.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이름을 올린 전시가 하나 있으니, 바로 미국 LA카운티뮤지엄(LACMA)에서 9월 11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개최하는 전시 <사이의 공간: 한국미술의 근대>다.
<사이의 공간: 한국미술의 근대>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작년 영화와 텔레비전 영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폭했고, 서구 사회의 여러 갤러리들이 서울에 문을 열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LACMA는 이미 수년 동안 한국 미술을 탐색해왔고, 마침내 이 기획전을 올리게 되었다.” 기자의 말처럼 오늘날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대중문화에서 촉발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미술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너무나 ‘적절한’ 타이밍에 LACMA가 한국 미술을 전면으로 내세운 전시를 개최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시가 열리는 2022년 9월 이전, 요즘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리라고 처음부터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LACMA와 국립현대미술관의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전시가 첫 삽을 뜬 것은 2019년의 일, 당시만 해도 한국이 이렇게까지 세계적인 ‘핫 이슈’의 중심에 있는 곳은 아니었다. 그런데 3년 전, LACMA의 큐레이터 버지니아 문(Virginia Moon)이 한국 근대 시기에 집중하는 이번 전시의 기획안을 쥐고 국립현대미술관의 문을 두드렸고, 이듬해 전시 준비의 구체적인 분담 내용을 담은 협약서가 체결되며 본격적으로 조사 연구, 작품 소재 파악, 대여 절차 진행, 도록 제작 등의 업무가 진행됐다. 그렇게 우연 혹은 필연이 작용하며 3년 전 돛을 올린 <사이의 공간: 한국미술의 근대>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에선 프리즈의 열기로 가득한 9월 초, 개막을 앞둔 전야의 어느 날 전시 현장을 직접 찾았다.

김환기가 파리 체류 시절 그린 ‘산월’. 화가가 마음 깊이 사랑했던 소재인 ‘조국의 자연’을 그린 작품이다. 김환기, 산월, 1958, 캔버스에 유채, 130×105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환기재단-환기미술관.

여인을 모델로 한 흉상 조각의 하나인 권진규의 ‘비구니’. 권진규, 비구니, 1971년경, 건칠, 37.3×26×50.2cm, 가나아트 소장 ©권진규기념사업회, 사진 이정훈.

어둡고 우울한 정조를 강조한 나혜석의 ‘자화상’. 나혜석, 자화상, 1928년경, 캔버스에 유채, 88×75cm, 수원아이파크미술관 소장.

이쾌대의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으로, 해방기 혼란 속에서 제작된 작품임에도 전문 화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표현했다. 이쾌대,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 1948-49년경, 캔버스에 유채, 72×60cm, 개인 소장.
기적처럼 살아남은 한국 근대기 예술 작품
이번 전시는 전천후로 ‘한국 근대미술’을 정조준한다. 지금까지 한국 미술을 주제로 서구권에서 열린 전시는 대부분 조선시대 이전 전통미술이거나 현대미술 중에서도 1990년대 이후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 한편 2010년대 중반부터는 1970년대 이후의 한국 단색화를 소개하는 전시가 상업적 성공을 타고 여러 갤러리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그 ‘사이’, 한국의 전통과 현대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어쩌면 <사이의 공간: 한국미술의 근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자,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 ‘공백’으로 자리했을 이 시대를 집중 조명하는 전시라 할 수 있다. 20세기 전반, 흔히 ‘근대’라고 불리는 시기는 한국 역사에서 ‘트라우마’ 자체였다. 19세기 세계 열강이 제국주의를 강력하게 키워가는 동안 꽤 오래 쇄국 정책을 고집하던 조선이 강제 개항을 맞고, 조선의 독립을 꿈꾸며 대한제국을 선포했지만, 결국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병합으로 이어지는 수난을 겪었다. 35년간 식민지 시대를 거쳐 해방되었지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고, 분단과 전쟁을 겪으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던 한국. 그 시대를 반추하는 일은 한국인으로서는 무척 괴로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놀랍게 생각되는 사실은, 바로 이런 시대에서도 예술가들은 살아남았고, 훌륭한 작품을 남겼다는 것이다. 전시는 1897년부터 1965년까지의 시기에 제작된 작품 130여 점을 선별해 소개한다. 개화기 사진을 비롯한 새로운 문물의 도입부터 시각 문화의 변화, 유화의 도입, 신여성의 출현, 근대미술의 다양한 전개, 추상으로의 이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담는 셈. 격동의 시대, 수많은 사연을 품은 채 태어나고 살아남은 작품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한국 근대미술을 주제로 한 서구권에서의 첫 기획전인 만큼,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근대 시기 작품을 대거 만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미국과의 통상조약을 체결한 지 2년 후인 1884년 조선을 방문한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이 처음으로 찍은 고종의 초상 사진이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서 대여되어 공개됐다. 조선의 정치적 독립을 꿈꾸며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 황제가 한일병합을 당하고 1919년 숨을 거두었을 때, 이를 슬퍼한 유학자 간재 전우를 위해 채용신이 그린 ‘고종황제어진’(1920)도 소개된다. 3·1운동 수배를 피해 중국을 거쳐 미국에 망명한 임용련이 미국에서 그린 작품 ‘십자가’(1929) 역시 다시 미국 땅을 밟았다. 일제강점기 도쿄에서 유학한 초기 유화가들 고희동, 김관호, 나혜석의 작품도 한국과 일본에서 실려 왔다. 1920년대 이미 독일에서 유학했던 배운성이 1935년 독일에서 처음 발표한 작품 ‘가족도’ (1930~35)는 외국인의 눈에 매우 이색적으로 보였을 한국인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전달한다. 해방 후 이념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제작된 이쾌대의 ‘군상’(1948), 한국전쟁의 혼란을 그대로 담은 이응노의 ‘폐허의 서울’(1954), 전쟁 중에도 따뜻하고 절제된 표현으로 보통 사람의 일상을 그린 장욱진의 ‘나룻배’(1951), 김환기의 ‘피난 열차’ (1951) 등도 걸렸다.
전체 출품작 중 대부분(111점)은 한국에서 나간 것으로, 그중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이 32점에 이르며 이번에 대거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 21점을 포함한다. 그 외 리움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이응노미술관, 김종영미술관 등 국내 주요 미술관과 개인 소장가의 중요 작품이 대거 출품되었다. 여기에 도쿄예술대학미술관 소장품,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한국 작품들도 망라되었다. 이번 전시에서 단연 흥미로운 점은 회화뿐 아니라 조각과 사진을 적극적으로 전시에 끌어들였다는 것. 조각과 사진이 전시를 더욱 입체적으로 또한 실감 나게 연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조각가로 김종영, 윤효중, 권진규, 최만린 등의 작품이, 사진가로 정해창, 문치장, 임석제, 성두경 등의 작품이 포함되었다. 한국 작가 총 88명이 이름을 올린 압도적인 규모의 전시라고 할 수 있다.

화가 채용신이 그린 고종 황제 초상화 ‘고종황제어진’. 채용신, 고종황제어진, 1920, 비단에 채색, 46.2×33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김환기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부산에 피란하며 그린 ‘피난 열차’. 김환기, 피난 열차, 1951, 개인소장, ©환기재단-환기미술관.

산 능선을 따라 노을이 지는 자연 풍경을 그린 유영국의 ‘작품’. 유영국, 작품, 1957, 캔버스에 유채, 101×101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유영국미술문화재단.

배운성의 ‘가족도’. 한옥을 배경으로 총 17명의 대가족이 마치 기념사진을 찍는 듯한 장면을 묘사했다.
격동의 시대, 역동의 역사
그 어느 때보다 격동의 시대였기 때문에, 어쩌면 수많은 충돌이 빚어낸 ‘역동성’을 더욱 풍부하게 품은 한국의 근대기. 조선시대 유교 문화에서 갑자기 세계의 온갖 문물과 사상이 쏟아져 들어왔으니, 그 당시 조선인이 느꼈을 충격과 고민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다. 이들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은 어떤 식으로든 그러한 충격과 고민을 반영하기에 더욱 흥미롭다. 한편 9월 8일, LACMA에서 열린 언론 프리뷰 현장에서LACMA의 관장 마이클 고반(Michael Govan)은 이번 전시는 단지 한국의 역사를 반영할 뿐 아니라 세계 역사의 일부라고 전했다. 한국은 분명 20세기 전반기 비극의 시대를 겪었지만, 어찌 보면 이 비극은 세계의 비극이기도 했다. 제국의 시대, 2번의 세계 대전, 이념 갈등, 냉전…. 이 모든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한국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혹은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이상과 꿈을 좇고 예술에 희망을 걸었을 거다. 그렇기에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그 많은 작품이 불타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끈질긴 생명력의 작품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운 현장은 뭉클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당시 예술가들이 살았을 시절엔 미술관이란 것도 없어 제대로 된 공간에서 전시 한번 한 적 없던 작품들, 그 이후에도 한국 땅을 떠난 적 없던 작품들이 바다 건너 멀리 LACMA에서 전 세계 관객을 맞고 있다. 이제, 옛 시대 예술가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냈는지, 그들이 죽음 이후 맞이하는 ‘글로리’가 얼마나 값진 감동을 주는지 직접 만나볼 일만 남았다.
- 피처 에디터
- 전여울
- 글
- 김인혜(국립현대미술관 근대미술팀 학예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