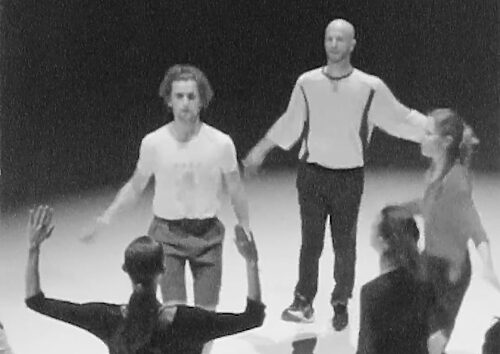옷과 주얼리의 기묘한 절충.
패션에 있어 창조라는 것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다. 대신 엇비슷한 아이템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입느냐가 중요해졌다. 뎀나 바잘리아와 로타 볼코바 아담, 조나단 윌리엄 앤더슨과 벤자민 브루노, 프란세스코 리쏘와 카밀라 니커슨처럼 독보적인 스타일리스트를 자신들 속으로 영입해 생경한 아름다움을 세상에 등장시키는 사례들은 동시대적 패션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가를 명백하게 증명한다. 덕분에 고지식한 것으로 저평가되던 브랜드들은 손맛 좋은 스타일리스트들을 영입하는데 혈안이 됐다. 그러나 이런 조합은 더 이상 놀라운 것이 아니게 됐고, 젊고 명민한 디자이너들은 다른 방식으로 민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단순히 옷을 입는 방식이 아닌, 소비자들의 욕망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건 신발도, 가방도, 시계도 아닌 주얼리에 있었다. 그간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던 재주 좋은 주얼리 디자이너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한 것이다. 디자이너들이 완성한 옷차림에 강렬한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한 방이 오직 주얼리뿐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듯 보인다.


GmbH의 세르핫 아이식과 벤자민 알렉산더 휴스비는 이탈리아의 주얼리 디자이너, 마르코 판코네시에 손을 내밀었다. 마르코 판코네시는 지방시와 발렌시아가는 물론 <더스트> 매거진과의 협업까지 이뤄낸 아주 재주 좋은 주얼리 디자이너다. 형형색색의 원석을 활용해 완성한 드롭 형태의 주얼리는 GmbH가 추구하는 바이 섹슈얼리즘에 아주 부합했고, 무대 위에서 성의 경계를 더욱 확고하게 무너트리는데 일조했다.


크리스토프 르메르 또한 마찬가지다. 그는 소피 부하이나 조앤 버크 등 건축적이고 조형적인 형태를 구축해내는 주얼리 디자이너들에게 끊임 없이 손을 내민다.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르메르의 옷들은 늘 묵직하고 견고한 주얼리들로 마무리되며 어떤 단단함을 내포한 옷으로 완성된다.
킴 존스가 디올 맨에 영입되자 마자 주얼리 디자이너로 매튜 윌리엄스와 윤 앰부시를 영입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볼 수 있다. 시대의 흐름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는 킴 존스 또한 ‘주얼리’가 주는 힘을 믿고 있는 것이다. 스타일을 완성하는 한 방이 사사로운 ‘주얼리’가 된 시절 속에서 그 어느 아이템보다 잘 다듬어진 주얼리 하나에 파고들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것이 커피 값에 불과한 SPA 브랜드의 어이링이어도 상관 없다.
- 프리랜스 에디터
- 김선영
- 사진
- Instagram @panconesi @lemaire_official @mrkimjo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