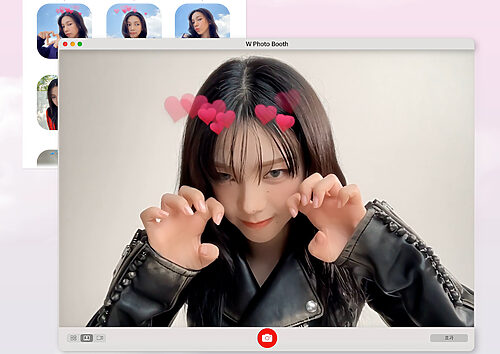더블유 패션 에디터들이 자신의 취향을 온전히 반영하여 엄선한, 2016년 가을/겨울 10대 컬렉션과 베스트 룩.
<Senior Fashion Editor_이경은>

STELLA JEAN

|스텔라 진|
이탈리아 밀라노를 베이스로 솔과 가스펠 음악 위주로 활동하는 ‘소울 보이시스(Soul Voices)’ 그룹이 추억을 소환하는 쿨리오의 ‘Gansta’s Paradise’와 ‘Amazing Grace’를 쇼가 진행되는 내내 열창한 스텔라 진 쇼. S/S 시즌보다 테일러링이 강해진 특유의 민속적인 룩을 걸친 모델들이 걸어 나오는 공간을 가득 메우던 그 음색이 전해준 오후의 전율을, 잊을 수 없다.

MARNI

MARNI
|마르니|
마르니 쇼는 언제나 일요일 아침에 열린다. 이번 쇼가 열린 일요일 아침에는 겨울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2월의 비가 자박자박 내렸다. 건축적인 실루엣, 예술적인 프린트와 장식, 묵직하고 다채로운 색 사용이 장기인 콘수엘로 카스틸리오니는 이번 시즌 시그너처 요소는 그대로 가져가되 곳곳에 스포티한 요소와 드레시한 주얼리를 배치했다. 가장 오래도록 기억에 남은 룩은, 조르주 브라크를 비롯한 입체파의 작품이 떠오른 프린트 시리즈다.

Y PROJECT

Y PROJECT

Y PROJECT
|Y/프로젝트|
와이/프로젝트를 눈여겨보는 이유 중 하나는 최근의 유행인 ‘전위적인 90년대 무드’와 ‘무성 레이블’을 표방하면서도, 여성성에 관한 다각적인 탐구가 드러나는 현실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베트멍보다 덜 거칠고, 마르케스 알메이다보다 덜 장식적인 글렌 마틴스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디자이너다. 부디 파이널리스트에 올라 있는 2016 LVMH 프라이즈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PRADA

PRADA

PRADA
|프라다|
누군가의 머릿속을 훔쳐볼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의 0순위 인물은 미우치아 프라다다. 그녀는 혁신적인 소재와 실루엣, 디테일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익숙한 아이템들의 새로운 조합과 변주로 경이로운 컬렉션을 만들어낸다. ‘방랑자’를 주제로 한 이번 컬렉션 역시 그랬다. 슈퍼모델 스텔라 테넌트가 코트 위에 코르셋을 걸치고, 코트 소매 위로 두터운 니트 장갑을 끼고, 레이스업 샌들에 니트 타이츠를 신고 뚜벅뚜벅 걸어 나올 때, 나도 모르게 숨소리를 죽였다.
|미소니|
미소니 하우스는 패밀리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는 몇 안 되는 유서 깊은 하우스 중 하나다. 그렇다고 디자인이 지루할 것이라 단정해선 안 된다. 안젤라 미소니의 활약이 점점 도드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이번 런웨이에 서른두 번째로 등장한 다리를 타고 부드럽게 떨어지는 통 넓은 니트 팬츠와 니트 드레스, 니트 풀오버가 조화된 룩은 소위 요즘 ‘뜬다’는 신진 디자이너들의 룩 이상으로 쿨했으며, 동시대적이고, 전통 있는 하우스의 터치가 더해져 우아하기까지 했다.
<Fashion Editor_정환욱>

CHANEL

CHANEL
|샤넬|
슈퍼마켓, 카페, 공항에 이은 샤넬의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 바로 그것이었다. 이번엔 또 어떤 콘셉트일까라는 기대감은 무산됐지만 놀라움은 그대로였다. 멀어서 옷이 안 보인다는 프레스들의 불만에 칼 라거펠트는 모든 이가 프런트로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93명의 모델은 드넓은 런웨이를 걷고 또 걸었다. 양쪽 끝에서 출발한 모델들이 지그재그로 이동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장관이었다.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든 건 사실이지만, 샤넬이기에 가능했던 특별한 쇼였다.

DRIES VAN NOTEN

DRIES VAN NOTEN

DKNY
|드리스 반 노튼|
이번 시즌 파리에서 본 쇼 중 무엇이 가장 좋았냐는 질문에 수도 없이 같은 대답을 반복하게 했던 드리스 반 노튼의 쇼. 다양하게 소개된 애니멀 프린트와 벨벳 소재, 프레피의 매치 등 하나의 베스트 룩을 꼽기 힘들 만큼 취향저격의 향연이었다. 특히 심장박동 같은 소리와 가끔씩 읊조리는 듯한 목소리가 전부였던 쇼 음악이 주는 긴장감은 옷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동안은 이 마성의 매력에서 헤어나지 못할 듯.

ROCHAS

ROCHAS

ROCHAS
|로샤스|
쇼 내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다름 아닌 형형색색의 양말! 드레스와 양말의 사랑스러운 매치가 쇼 내내 상남자인 내 마음을 쥐고 흔들었다. S/S 시즌으로 착각할 만큼 상큼한 컬러와 플로럴 프린트 등 화사한 룩으로 가득했던 것이 특징이다. 하늘색 원피스와 다홍빛이 도는 양말, 녹색 플랫폼 슈즈의 오프닝 룩이 나온 순간, 이미 게임 끝났다.

DKNY

DKNY

DKNY
|DKNY|
1990년대 강한 걸그룹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다오이 초와 맥스웰 오스본 듀오의 시즌 콘셉트는 딱, 내 스타일이었다. 무심하게 걸쳐 입은 오버올, 스커트에 매치한 아노락 점퍼 등 스포티한 아이템이 적용된 스타일링이 돋보였다. 특히, 90년대 힙합 무드를 느낄 수 있던 과도하게 큰 멜빵바지와 크롭트 톱이 쇼의 백미.

PORTS 1961

PORTS 1961

PORTS 1961
|포츠 1961|
화려한 컬렉션들 틈에서 잘 정제된 듯한 포츠 1961은 그래서 더욱 눈에 띄었다. 미니멀하지만 비대칭이나 절개, 길게 늘어뜨린 줄로 재미를 준 의상들이 수시로 떠오른다. 핑크색 앙고라 니트 원피스는 다른 의상들과의 연계성에서는 다소 의문이 들었지만 마음에 쏙 들어서 베스트로 뽑지 않을 수 없었다.
<Fashion Editor_김신>

UNDERCOVER

UNDERCOVER

UNDERCOVER
|언더커버|
디자이너들이 상상하는 그래니 룩은 무엇일까, 궁금한 적이 있다. 준 다카하시가 그린 그래니 룩은 금속 가시 왕관 헤드피스를 쓰고 편안한 니트 웨어로 감각적인 레이어링을 한 괴짜 할머니. <나니아 연대기> 속 틸다 스윈턴을 연상시킨 그의 쇼는 어떤 모습으로 늙어가야 할까 고민하던 나에게 답을 준 최고의 쇼였다.

GUCCI

GUCCI

GUCCI
|구찌|
오리엔탈, 너드, 르네상스, 클래식, 페미닌, 키치, 스트리트 무드까지. 진지함과 유머를 넘나들던 70벌의 의상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면, 우아한 로맨티시즘이 아니었을까. 하늘하늘한 민트색 시폰 드레스에는 정교하게 수놓인 재규어가 있었고, 뒷면에는 캐주얼한 야구점퍼에나 있을 법한 백 넘버가 새겨져 있었다. 쇼를 보는 내내 영화 <Her>에서 인상 깊었던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좋아요”라는 대사가 맴돌았다.

YEEZY SEASON3

YEEZY SEASON3
|이지시즌3|
뉴욕 패션위크의 시작을 알리며 성대하게 치러진 카니예 웨스트의 이지시즌3.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는 거리에서 픽업한 1천여 명의 모델이 빼곡하게 서 있었다. 마치 민족 대이동을 연상시키는 웅장함은 바로 컨템퍼러리 아티스트 바네사 비크로프트의 손에서 비롯된 것. 그 웅장함이 모든 걸 압도한 케이스. 자연주의 힙합 전사 룩이 심지어 당장 입고 싶어졌다.
|모스키노|
제레미 스콧이 철없는 생각을 할 때보다,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할 때의 모스키노를 좋아한다. 이번 쇼가 그 간극을 채우기에 가장 적당했던 쇼 아닐까. 그는 늘 상상을 머릿속에만 두지 않고, 현실로 끄집어낸다. 드라이아이스를 드레스 안에 장착한 불 타는 드레스를 입고 안나 클래버랜드가 기괴한 춤을 추며 나올 때, 진심으로 그를 응원했다.
- 에디터
- 이경은, 정환욱, 김신
- 포토그래퍼
- COURTESY OF INDIG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