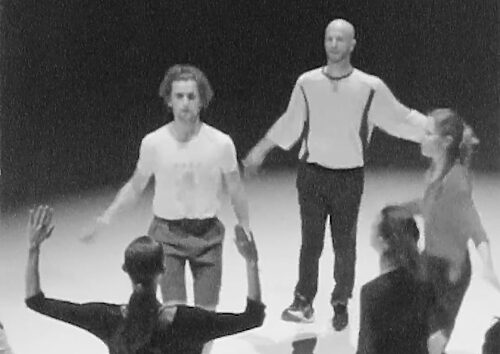이달, 패션 에디터들은 손으로 겨울 옷을 만지고, 눈과 머리로 봄 옷을 헤아렸다. 뉴욕에서 시작해 런던과 밀라노를 거쳐 파리까지, 한 달간의 2014년 봄/여름 컬렉션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온 에디터들의 감식안에 포착된 이슈들!

이것이 꿈이라면 깨지 않았으면 했다. 펜디가 몬테나폴리오네의 새로운 부티크 오프닝을 기념하며 마련한 꿈의 공간! 펜디와 영화의 깊은 인연을 보여준 전시 <Making Dreams: Fendi and The Cinema>는 영화 속에 등장한 펜디 모피를 아우른다. 단순히 퍼와 영화 스틸 사진을 1차원적으로 배열하는 대신 만초니 극장 자체를 거대한 유기체처럼 꾸며놓은 전시 형식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디지털 복원한 루치노 비스콘티 감독의 1974년 작 <가족의 초상> 속에 등장한 룩을 재현한 전시물은 한참이나 넋을 놓고 봤는데, 마치 시공간을 초월한 듯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모스키노의 30주년 기념 컬렉션이 열린 쇼장은 월요일 출근 시간대의 지하철을 방불케 했다. 심지어 꾸역꾸역 몰려드는 인파로 인해 가뜩이나 늦은 저녁에 시작한 쇼는 1시간 이상 지체되었다. 더군다나 인간숲에 가려 옷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땀을 육수처럼 뻘뻘 흘리며 쇼를 보고 난 다음 날. 두오모 성당 근처를 지나다 어젯밤 나를 아비규환에 몰아넣었던 의상을 발견했다. 밀라노의 햇살 아래서 화보 촬영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 이렇게나마 ‘제대로’ 의상을 볼 수 있게 된 건 신의 뜻이 아니었을까?

쇼를 보기 위해 다급하게 달려온 이들이 소중하게 부여잡고 있는 초대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다. 더블유 막내 에디터의 이날 룩과 No.21 초대장의 근사한 조화를 보시라!

여유로운 런웨이와 달리 백스테이지에선 치열한 ‘체험,삶의 현장’이 생중계된다. 쇼 시작 직전, 아니 심지어 진행되는 와중에도 스태프들의 손발은 불난 호떡집마냥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한쪽에선 잔뜩 달아오른 얼굴로 모델의 옷매무새를 광속으로 다듬는가 하면, 또 한켠에선 1mm의 주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표정으로 ‘폭풍’ 다림질에 열중한다. 모델들의 구박 속에 초를 다퉈가며 옷을 입히는 헬퍼들의 노고는 또 어떻고. 뒤에서 묵묵히 제 일에 몰두하는 스태프들이 있어 ‘완벽한’ 쇼가 태어날 수 있는 것!

만약 촘촘한 쇼 일정을 소화하느라 진이 빠진 내게 “앉아서 쇼만 보는데 뭐가 힘드냐?”라고 일갈한다면 뒤통수를 후려칠지도 모른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1시간 혹은 30분 단위로 이어지는 쇼와 PT일정을 소화하느라 밀라노 전역을 돌다 보면 항우 장사도 기진맥진해지리라. 그런데 세르지오 로씨의 프레젠테이션 장 앞의 초록 풍경을 바라볼 때만큼은 내 영혼에 자양강장제를 주입하는 기분이었다.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보낸 5분간의 달콤한 여유, 잊지 않으리.

이번 밀라노 패션위크에서 가장 인상적인 쇼를 묻는다면 주저 않고 프라다와 토즈를 꼽으리라! 프라다는 보는 이의 시신경을 자극하는 총천연색의 패션 판타지로 밀라노 패션위크의 왕임을 몸소 증명했고, 실로 오랜만에 본무대로 돌아온 알레산드라 파키네티의 첫 번째 토즈 쇼 역시 나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컬렉션. 특히 쇼 이후 리씨(Re-See) 를 통해 가까이서 본 토즈의 의상과 액세서리는 통장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신이시여!

마르니 쇼는 밀라노의 멋쟁이들이 운집하는 쇼로 유명한데, 이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쉴 틈 없이 눈동자를 굴리며 주변을 스캔하던 와중에 시선이 멈춘 지점은 낭창낭창한 몸매에 발랄한 스쿨걸 룩을 걸친 아가씨. 그런데 고개를 들어 얼굴이 보이는 순간, 그 충격이란! 메시 스웨트 셔츠에 미니 플레어스커트를 매치한 아가씨(?)의 얼굴 겉보기 등급은 적어도 40대 후반 혹은 50대 초반에 가까웠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뻤다.’

패션쇼만큼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는 곳이 있을까? 쇼장에 입성하기 위해선 때론 갖은 꼼수와 눈치 작전이 동원되는데 운만 따르면 초대장 없이도 침투가 가능하다. 하지만 초대장이 없다면 개미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는 쇼가 있기 마련. 프라다와 돌체&가바나가 그렇다. 특히 돌체&가바나는 지난 맨즈 컬렉션 당시 전라의 불청객이 런웨이에 난입하는 바람에 경비가 더 삼엄해졌다. 눈에 불을 켠 가드가 일일이 여권과 초대장의 이름을 대조하고 심지어 초대장에 찍힌 바코드를 스캔, 당사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추가로 입장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

‘역시 스테파노 필라티’. 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아뇨나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선보이는 첫 번째 무대는 패션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파괴한 시즌리스 개념의 <#0 컬렉션>. 심지어 이번 컬렉션은 런웨이나 쇼룸이 아닌 팝업 스토어 형식으로 진행, 프레스와 바이어는 이 계절을 뛰어넘은 컬렉션을 그 자리에서 보고 구입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형식만 그럴 듯했을까? ‘슬림’과 ‘오버사이즈’, ‘대칭’과 ‘비대칭’등 상반된 요소를 자유자재로 요리한 의상과 액세서리는 다분히 스테파노 필라티다웠다. 특히 아뇨나의 창립연도를 표기한 스웨트 셔츠와 체크 패턴의 ‘팔라카 모티프’ 시리즈는 ‘대박’의 조짐으로 충만한 아이템.
- 에디터
- 컨트리뷰팅 에디터 / 송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