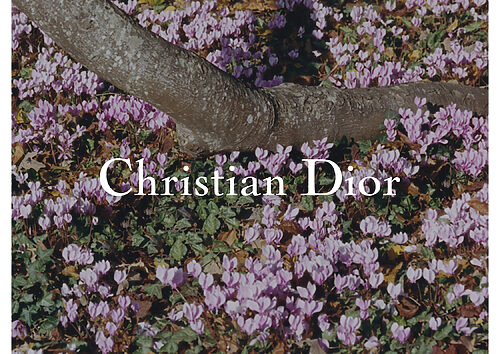도시의 언더그라운드
대도시 시민들의 삶이 교차하는 공공의 공간. 모두의 지하철이 이제 하이패션 세계 안에서 새로운 장면을 쓰고 있다.

“뉴욕 지하철은 모두의 것입니다. 학생부터 혁신가, 정치인, 10대 등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죠. 신비롭고도 멋진 만남이 가득하고, 팝 문화의 전형적인 캐릭터가 출몰하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차려입은 사람들이 각자의 갈길로 향하는 곳입니다.” 샤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티유 블라지는 2026 공방 컬렉션을 선보인 뒤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2월, 뉴욕 로어이스트 사이드의 폐쇄된 지하철역 보워리(Bowery)에서 열린 샤넬의 ‘2026 공방 컬렉션 쇼’는 단숨에 도시로 시선을 집중시켰다. 패션계와 거리가 먼 지인들마저 처음으로 패션쇼 영상을 찾아봤다고 말할 만큼, 그 시기 쏟아진 반응과 뉴스의 양은 압도적이었다. 지금 지구에서 가장 럭셔리한 패션 하우스 중 하나인 샤넬이, 가장 대중적인 공공 공간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하이패션을 일상의 공간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제스처였다.
지하철역이 패션쇼 무대로 활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톰 포드는 2019년 9월, 버려진 보워리 지하철역을 거칠고도 독특한 런웨이로 탈바꿈시켜 2020 S/S 컬렉션 쇼를 펼쳤다. 당시 뉴욕 패션위크를 떠올려보면 어퍼이스트 사이드부터 웨스트, 로어 사이드까지 도시 곳곳을 가로지르며 이동해야 해 진땀을 뺀 기억이 생생하다. 타미 힐피거는 할렘의 극장에서, 랄프 로렌은 맨해튼의 랄프스 클럽에서, 에카우스 라타는 브루클린의 창고에서 쇼를 열었다. 뿐만 아니라 서러게이트 법원이나 맨해튼 남부의 스프링 스튜디오 웨스트 빌리지의 레스토랑 등 비전통적인 장소를 탐색하는 트렌드가 이 시기에 있었다. 그런 와중에 지하철 플랫폼으로 걸어 내려가 요금을 내지 않고 들어서는 경험은 기묘하고 신선한 감흥을 선사했다. 매일 스쳐 지나던 일상의 공간과 하이패션이 교차한 순간이었다. 포드는 쇼 노트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1965년, 뉴욕에서 앤디 워홀과 이디 세즈윅이 맨홀 뚜껑을 열고 나오는 장면을 포착한 사진이 출발점이었어요. 지하철이야말로 아주 철저하게 ‘뉴욕적인’ 공간이지 않나요?” CFDA 회장 취임 후 선보인 그의 첫 쇼였던 만큼, 가장 적절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덧붙이자면, 발렌티노는 그보다 앞선 2019년 4월, 나오미 캠벨이 스팽글 장식의 오트 쿠튀르 드레스를 입고 보워리역에서 촬영한 캠페인 컷을 공개하며 이 공간을 먼저 호출하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 모스키노는 뉴욕 트랜짓 뮤지엄의 빈 지하철 차량 안에서 프리폴 컬렉션을 선보였다. 디자이너 제레미 스캇은 도시와 지하철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객차 내부를 런웨이처럼 구성하고 스트리트 룩을 풀어냈다. 이 쇼는 공공 교통이라는 상징적 공간을 패션과 연결한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한편 이탈리아 브랜드 알베르타 페레티도 2008년 뉴욕 지하철을 광고 캠페인 배경으로 활용해 뉴욕의 에너지와 도시적인 섹시함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다른 도시의 지하철은 어떨까. 마르지엘라는 1992년, 파리에서 기존 패션쇼의 문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공되지 않은 도시 공간인 지하철에서 컬렉션을 선보였다. 관객과 모델, 패션과 일상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이었다. 이렇게 돌아보면 패션이 일상의 공간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역사는 이미 30여 년을 넘는다. 2000년대 초반 발렌티노와 돌체앤가바나가 런웨이를 거리로 확장하며 ‘모두의 패션’을 제안했던 흐름 역시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패션과 현실의 접점을 강조하며 일상으로 스며든 하이패션이 도시 전체를 품는 럭셔리로 확장되고 있다. 그와 함께 도시와 이동, 시간의 감각을 품은 지하철은 쇼의 무대이자 브랜드 경험을 시각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장치로 떠올랐다. 우리의 일상 속 공간에서 모두의 패션이 된 럭셔리는 또 한 번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장면을 예고한다. 자, 이제 다음 역은?
- 사진
- COURTESY OF CHANEL, TOM FORD, MOSCHINO, MAISON MARGIE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