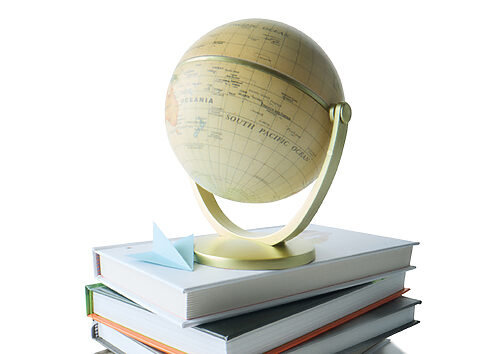2 주 전에 턴테이블을 구입하고 바이닐의 세계에 발을 들인 나는 깨달았다. 아차, 내가 제 발로 개미지옥에 굴러들어갔구나. 에디터는 어쩌다 자발적 중독자가 되어 LP를 앓고 있나.

수시로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 신상품과 가격을 체크한다. 남의 집이나 사무실, 카페에 가서도 오직 그것만 눈에 들어온다. 몇 안 되는 수집품을 밤마다 늘어놓고는 들여다보고 만지작댄다. 시계나 가방, 신발 같은 데 중독된 사람들도 다들 이런 증세를 거칠까? 분명한 건 시계나 가방, 신발은 수천 개, 수만 개까지 소유하는 게 불가능하리라는 거다. 턴테이블을 구입한 지 2 주일째, 현재 LP 13장. 내 시작은 미약하나 욕심은 창대하게 꿈틀대고 있다.
2주 전, 카페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이베이에서 구입한 빈티지 포터블 턴테이블을 가게에 갖다 놨으니 한번 보러 오라고. 주변에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은 턴테이블을 제법 갖고 있고, 내가 그들에게 LP를 선물한 적도 많지만 막상 내가 LP에 손을 대는 건 의식적으로 피해왔다. 이미 살면서 야금야금 모아온 책과 CD, 옷만으로도 혼자 사는 좁은 집이 허덕이니까. 물건에 집착하는 내 성격, 한 가지에 몰입하는 성향을 아는 친구들 역시 충고했다. LP를 시작하는 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일이니까 너는 마약처럼 여기고 애초에 손도 대지 말라고. 그런데, 빈티지 포터블 턴테이블을 보자마자 사버렸다. <문라이즈 킹덤>에서 소년과 소녀가 바닷가에서 프랑수아 아르디의 노래를 틀어놓고 춤추던 바로 그 모델이다. 이유는 다른 충동구매와 같았다. ‘예뻐서’. 어릴 적 집 거실에서 퇴출당하기 전의 고대 유물, 그리고 선배들을 따라 드나들던 LP바에 남아 있는 화석으로서 말고 바이닐이 지금 살아 있는 문화로 ‘다시’ 눈에 들어온 건 몇 년 전 뉴욕에서였다. 편집매장인 어번 아웃피터스에서 옷이며 액세서리, 리빙 제품과 함께 여러 종의 LP, 그리고 귀여운 디자인의 턴테이블을 팔고 있었다. 레드 제플린이나 비틀스가 아니라 애니멀 컬렉티브, 본 이베어, 뱀파이어 위크엔드 같은 요즘 쿨한 밴드들의 신보가 LP라니, 그리고 그걸 듣기 위해 턴테이블을 (마치 아이팟이나 이어폰 사듯) 가볍게 쇼핑하다니! 턴테이블과 앰프, 오디오 세트는 정착한 중년의 음악 감상용이며 젊은이들은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휴대용 개인 디지털 기기에 속한다는 나의 이분법에 균열이 간 순간이었다. 그 후 해외 페스티벌에서 레코드 스토어 데이(매년 다양한 뮤지션의 음반을 LP로 제작해서 한정 판매하는 이벤트)의 열기를 목격하고, 국내에도 레코드 페어가 생기는 걸 목격하면서 영미권에서 CD가 쇠하는 대신 오히려 LP로 옮겨가는 트렌드를 접했다. 이 매체가 더 이상 아날로그 세대의 추억이 아니라 10대, 20대가 음악을 즐기는 방식으로 여겨지게 된 새로운 위상을 발견한 거다.
집에는 물론 수백 장의 CD가 있고, 몇백 기가 분량의 MP3파일이 있지만 LP로 음악을 듣는 경험은 신기하게 두근거리는 구석이 있다. 신중하게 판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카트리지를 올리고, 동그란 레코드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동안 커버를 들여다보노라면 가슴이 뛴다. 용돈을 모아 샀던 아이와 워크맨에 카세트 테이프를 넣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던 황홀,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으면 레코드 가게로 달려가 CD를 고르던 흥분을 다시 만나는 순간이다. LP는 음반 표면의 홈에 지문이 묻지 않게 조심스럽게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잡아야 하고, 한 면이 다 돌아가면 판을 뒤집어줘야 한다. 참으로 귀찮고 손이 많이 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20 분 동안만 나한테 집중해봐’ 하는 LP의 물리적 제약은, 노래 하나하나를 더 특별하고 사랑스럽게 만든다. 쉽게 다운로드받아 하드 속에 방치된 수많은 앨범, 파일이나 스트리밍 서비스로 언제든 틀 수 있는 노래들이 그 방대함과 용이함 때문에 잊혀진 존재가 된 것과 반대다.
런던에서 인터뷰한 틸다 스윈턴은, 기숙 학교에 다니던 열세 살 소녀 시절에 데이비드 보위의 <알라딘 세인> 앨범 커버만 보고 반해 처음으로 LP를 구입한 경험에 대해 들려주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장비가 전혀 없어서 3년 동안 재킷을 들여다보고, 어떤 노래일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고. 우리는 멜론이나 벅스로도 얼마든지 음악을 듣고 즐기지만, 디지털 싱글이나 음원 차트 1위곡에 ‘반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상상하기 힘들다. LP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사랑의 종류를 나누자면 이건 에로스다. 실체와 촉감과 냄새를 갖고 있는 대상과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사랑, 만질 수 있는 관계의 희열. 음악을 아가페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LP와의 에로스만큼 중독적이기는 어려울 거다. 너는, 크고 아름다워.
- 에디터
- 황선우
- 포토그래퍼
- 엄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