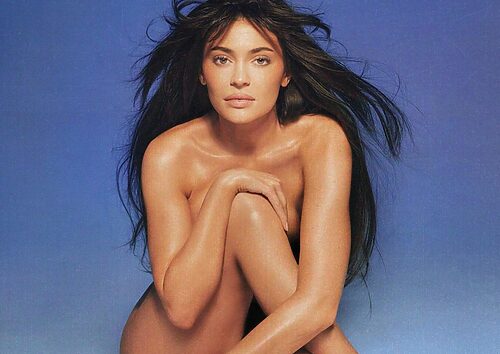길지 않은 언어로 슬픔, 고통, 폭력에 관한 무수한 이야기를 풀어놓는 신간 시집 세 권.
현대시라는 문학은 종종 내가 아는 말로 쓰인 다른 세상의 말 같기만 하다. 시인의 함축된 언어에 담긴 뜻을 알아채려면 지성을 갈고닦아야 할까, 감성을 키워야 할까? 그런데 암호로 가득한 시집을 곁에 하나쯤 두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책장을 넘겨 입술을 움직여 읽어보면, 짧은 구절이 긴 여운을 남길 때가 있다. 이를테면 장석주의 <헤어진 사람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문학동네)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한다. “연애가 찬밥과 슬픔으로 부양되더라도 / 연애건 이별이건 섣불리 하지 마라 / 연애하는 내내 나는 눈물이 났다”(‘연애’), “왜 우리는 늙나요 / 늙으면 옛날의 미래로 돌아갈 수 없나요”(‘노포에서’) 장석주가 ‘작아지려고 탕약처럼 뭉근한 불로 오래 졸였다’고 소개하는 이 시집은 일상의 작은 슬픔을 통해서 큰 슬픔에 가닿기 위한 시인의 언어로 채워졌다.
시에서 위로를 받을 생각으로 정다운의 시집 <파헤치기 쉬운 삶>(파란)을 펼쳤다간 당혹스러울 수 있다. “좋은 삶이다 남의 맘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들은 / 지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맘 따위 발로 까버릴 / 자세가 되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파헤치기 쉬운 삶’), “너를 죽이는 꿈을 꿨어 / 목에 가느다란 줄을 감아 들고 다녔어 / 자기 몸무게로 목이 졸려지는 너의 / 안간힘이 줄을 흔들었어”(‘꿈인 줄 알았네’)처럼 삶의 굴욕과 고통 등을 적나라한 언어로 조곤조곤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인이 아픈 말을 감내하며 시 쓰기를 멈추지 않기에, 이 책을 펼치면 ‘시를 읽는다’는 느낌보다 ‘시인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제37회 김수영 문학상 수상 시집인 이소호의 <캣콜링>(민음사)은 충격적인 고백으로 가득하다. “가진 게 다리뿐인 우리는 살아야 했다 / 배고플 때마다 이불 속에서 똥구멍을 조이는 연습을 했다 (중략) 이제 / 가족을 말하지 않고 나를 말하는 방법은 / 핑계뿐이다”(‘경진이네-거미집’) 시인은 경진이라는 시적 화자를 내세워 다양한 심상으로 가부장제와 성폭력 등을 고발한다. 인쇄가 잘못된 것마냥 글자가 흐릿하다거나 빽빽하게 겹쳐 있는 특이한 시각 효과도 활용한 시집이다. 세 시집을 곁에만 두어도 세상의 애상과 고통과 폭력이 이토록 선명하게 다가오는데, 시집을 탐독하는 날에는 얼마나 진한 감정이 휘몰아칠까?
- 피처 에디터
- 권은경
- 포토그래퍼
- 엄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