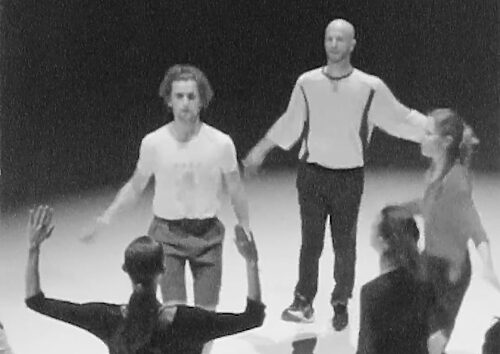아침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이 새로운 계절이 도래했음을 알린다. 우아한 벨벳이 드리워진 뉴욕을 시작으로 만화적 상상력을 더한 판타지, 플라워 테라피로 이어진 런던, 파워풀한 레드와 글리터가 장악한 밀란, 맥시멀리즘의 선봉자인 파리까지. 4대 도시의 2017 F/W 핵심 트렌드를 추렸다.
New York
레인보 벨벳

ALTUZARRA

MONSE

ZERO+MARIA CORNEJO

JEREMY SCOTT

DION LEE

JILL STUART

JASON WU
2017 F/W 뉴욕 패션위크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등장한 소재 중 하나는 다름 아닌 벨벳이다. 가을을 대표하는 소재답게 특유의 흐르는 듯한 실루엣을 여러 쇼에서 만날 수 있었다. 하이라이트는 알투자라와 몬세의 쇼였다. 셰익스피어의 소설 <Lady Macbeth>에서 영감 받은 알투자라는 “Look like the innocent flower. But be the serpent under it.(순진한 꽃처럼 보여라, 그러나 그 밑의 뱀이 되어라)”라는 맥베스 부인의 말을 인용하며, 그녀를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열쇠로 벨벳을 떠올렸다. 몬세의 다채로운 컬러 플레이 또한 인상적이었다. 레드부터 골드, 블루, 블랙 등이 한데 어우러진 벨벳 물결이 런웨이를 채색했다. 여성스럽게, 중성적으로, 때로는 매니시하게 그야말로 ‘열일’한 벨벳이다.
캡틴 아메리카

PUBLIC SCHOOL

PUBLIC SCHOOL

PRABAL GURUNG

GYPSY SPORT

GYPSY SPORT

PHILIPP PLEIN

CALVIN KLEIN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열린 뉴욕 패션위크, 화제의 중심에는 당연하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말 많고 탈 많은 그의 정책이 있었다. 디자이너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메시지를 던졌다. 대선 기간 트럼프가 쓰고 다니던 빨간 모자를 기억하는가? 퍼블릭 스쿨의 다오이 초와 맥스웰 오스본은 트럼프의 선거 문구였던 ‘Make America Great Again’을 뒷부분만 살짝 바꾼 모자로 그의 철학을 비꼬았고, 프라발 구룽은 ‘I am an Immigrant’나 ‘The Future is Female’과 같은 문구가 적힌 티셔츠 퍼레이드로 박수 갈채를 받았다. 글이나 말로 꼭 집어 이야기해야만 그 의미가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집시 스포츠의 리오 우리베는 이민자와 소수자를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쇼로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나란히 뉴욕 데뷔를 한 라프 시몬스와 필립 플레인의 극단적으로 다른 성조기 디자인도 재미있는 볼거리.
팔 전성시대

CALVIN KLEIN

VIVIENNE TAM

ALTUZARRA

VICTORIA BECKHAM

VICTORIA BECKHAM

TOME

CAMILLA

DIANE VON FURSTENBERG
U. S. ARM? 밀리터리나 카무플라주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다. 뉴욕의 많은 디자이너들은 이번 시즌 ARMY가 아닌 ‘ARM’, 팔에 집중했다. 팔꿈치를 훌쩍 넘기는 롱 글러브, 팔을 감싸는 암워머가 바로 이번 트렌드의 주인공이다. 그 포문을 연 이는 뉴욕의 오프닝을 맡은 캘빈 클라인의 라프 시몬스. 새빨간 니트 스커트, 가슴 앞부분이 시원하게 뚫린 톱의 커팅도 인상적이었지만, 시선을 사로잡은 건 클래식한 테일러드 재킷에 노란색 니트 워머가 레이어드된 ‘팔’이었다. 비비안 탐 역시 니트 소재의 암워머를 재킷 위에 매치한 굉장히 흡사한 스타일을 선보였다. 이런 현상은 소재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하게 변주되었는데, 알투자라와 빅토리아 베컴의 드레스 룩은 가죽 롱 글러브로 스타일링에 힘을 더했고, 토미는 바야바를 연상시키는 긴 퍼로 팔을 강조했다. 스타일과 실용성을 겸비한 뉴욕의 팔 사랑이야말로 진정 뉴욕스러운 트렌드가 아닐지.
London
망가 월드

MOLLY GODDARD

ASHISH

ASHISH

FYODOR GOLAN

FYODOR GOLAN

GARETH PUGH

HOUSE OF HOLLAND

HOUSE OF HOLLAND

LYAN LO

RYAN LO

MARY KATRANTZOU

MARY KATRATNZOU

ANYA HINDMARCH

ANYA HINDMARCH
어지러운 속세에서 패션이 주는 판타지를 잊지 않고 다시금 상기시킨 런던. 컬트, 로맨틱, SF, 블랙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 안에서 디자이너들은 기상천외한 캐릭터들을 런웨이로 소환했다. 특히 여심을 사로잡은 로맨틱 장르의 몰리 고다드는 이번에도 그녀의 주무기인 시폰 소재를 주로 활용했는데, 캉캉 드레스의 풍성한 볼륨은 로맨틱함을 넘어 실험적인 단편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그렇다고 런던 디자이너들이 펀하고, 영한 쇼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오산. 오래 들여다봐야 그 뜻을 파악할 수 있었던 블랙코미디 장르의 아시시 쇼에서는 모델들이 레슬링과 같은 무시무시한 분장을 하고,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황금빛 런웨이를 걸어 나왔고, 룩 군데군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를 향한 저항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소비를 조장하고, 허영에 빠지게 하는 주범인 패션이 세상을 향한 작은 소리를 낼 수 있고, 나아가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보여준 것. 그 밖에 가레스 퓨의 호러 영화, 하우스 오브 홀랜드의 서부 판타지 만화영화, 라이언 로의 일본 망가, 크리스토퍼 케인의 SF 우주 영화 등 장르를 넘나드는 만화영화의 세계는 런던 쇼에 유쾌한 재미를 더했다.
플라워 테라피

CHRISTOPHER KANE

ERDEM

ERDEM

MARY KATRANTZOU

MULBERRY

PREEN BY THORNTON BREGAZZI

SIMONE ROCHA

TEMPERLEY

J.W. ANDERSON

ASHILY WILLIAMS
디자이너에게 꽃은 무한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아이디어의 보고다. 이번 시즌 런던 디자이너들의 꽃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과연 크리스토퍼 케인이 꽃으로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꽃 사랑은 유명하다. 그는 이번 시즌 실제 꽃보다 더욱 진짜 같은 꽃을 만들어 룩 곳곳에 브로치처럼 장식했다. 재미있는 건 꽃이 붙어 있어야 할 자리가 다리 사이나 무릎같이 절대 달려 있지 않을 것 같은 곳에 장식되어 있었다는 점. 한편 꽃 사랑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에르뎀은 이번 시즌 중세 시대의 복식과 꽃을 조합시켰는데, 꽃을 다루는 방식에 워낙 베테랑이라 자수, 크로셰 기법은 물론이고 벨벳 특유의 광택을 활용해 시선을 모았다. 벨벳에 꽃 프린트를 넣어 명화 같은 효과를 낸 시도는 황홀했을 정도. 그 밖에도 마리 카트란주가 표현한 우주를 떠도는 꽃 행성, 멀버리가 보여준 빈티지 꽃무늬 퀼팅 케이프, 아방가르드하고, 동양풍의 플라워 플레이를 보여준 프린, 밀리터리와 꽃이라는 기묘한 조합으로 호평을 받은 시몬 로샤까지. 이번 시즌 런던이라는 꽃밭은 종을 알 수 없는 이름 모를 꽃들로 장관을 이루었다.
모던 레트로

PRINGLE OFSCOTLAND

MULBERRY

MULBERRY

ASHILEY WILLIAMS

ASHILEY WILLIAMS

EMILLIA WICKSTEAD

BURBERRY
런던은 다른 도시에 비해 전통적이며, 영국 색이 짙은 브랜드가 많다. 이번 시즌은 그런 브랜드들이 동시대적으로 변모하기 위해 경주한 다양한 시도가 자주 목격되었고, 이와 더불어 클래식한 아이템으로 모던한 변주를 내세운 디자이너도 눈에 띄었다. 대표적으로 런던의 오래된 니트 브랜드 프링글 오브 스코틀랜드는 클래식한 영국식 아가일 체크 니트에 후디를 매치해 스포티와 클래식의 새로운 조합을 제안했고, 멀버리 역시 클래식한 체크무늬, 퀼팅 소재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컬러의 아이템을 매치해 신선함을 불어넣었다. 특히나 이번 시즌 멀버리는 스타일리스트 로타 볼코바의 합류로 전통적이고 고루할 것 같아 피했던 아이템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스타일링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젊은 디자이너들 역시 클래식과 모던의 경계를 넘나들어 인상적이었다. 애슐리 윌리엄스의 경우, 70년대 런던 체크에 웨스턴과 스포티 무드를 접목해 클래식을 기반으로 한 신선한 기운을 실어 넣었고, 토가 역시 체크 슈트의 해체, 의외의 색과 체크무늬의 접목 등으로 옷장 속에 넣어두었던 클래식한 아이템들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 에디터
- 정환욱 ·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