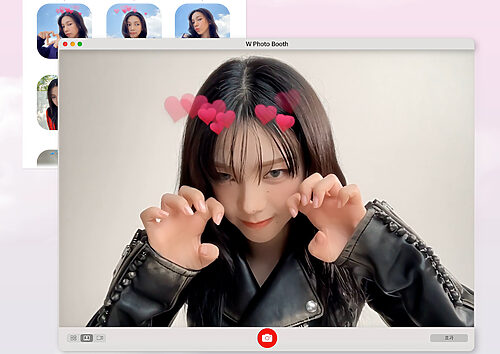백스테이지 헤어 스타일리스트? 패션쇼 모델들의 헤어를 만지는 사람. 디자이너와 함께 패션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항상 무대를 꿈꾸는 사람. 쇼 중독자. 여기 백스테이지 헤어 스타일리스트라고 불리는 한 남자가 있다.

이 남자를 처음 마주친 건, 10여 년 전 서울 컬렉션 백스테이지 현장. 날카로운 눈매로 스태프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모델들의 헤어를 손보고 있던 작은 남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건 한 달 전. 역시 서울 컬렉션 백스테이지 무대. 아마 20년 전, 또는 7년 전에 보았다고 해도, 그건 아마 같은 곳, 백스테이지 구석이었을 거다. 하는 일은 헤어 스타일리스트인데, 쇼 디렉터란 타이틀이 왠지 더 잘 어울리는 남자. 때론 기특하기도 때론 꼴사납기도 했던 한국 패션계 역사를 처음부터 쭉 지켜봐온 남자. 30년 동안 4200여 개의 쇼를 해봤으면서 아직까지도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희열을 맛본다는, 행운아. 거칠지만 순수하고,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담백한 원리를 가진 남자. 오민과의 거침없는 인터뷰.

1. SFAA 컬렉션 진태옥 쇼. 2. 디자이너 박윤수의 광고.3. 스파 컬렉션 박윤수 쇼. 4. 오민 개인 포트폴리오. 5. 모델 박영선과 함께했던 개인 작업물. 6. 오리엔탈리즘을 주제로 했던 <보그>의 화보. 7. 서울 컬렉션 김영주 쇼. 8. 수중 촬영으로 화제가 됐던 <보그코리아>의 화보. 9. <더블유코리아>의 창간 5주년을 기념한 패션 화보. 10. 디자이너 박윤수의 패션 화보. 11. 로레알 프로페셔널 파리의 광고. 12. <로피시엘>의 화보. 13. 서울 컬렉션 신장경의 무대. 14. 패션 브랜드와 함께했던 촬영 작업물.
주로 백스테이지에서 봐왔다. 일 년에 몇 회의 쇼를 하나?
가장 많이 했을 때는 310여 개까지 해봤다. 추려보니 그동안 4200여 회를 해온 거 같다.
아, 헤어 스타일리스트란 타이틀을 언제 달았는지부터 물어야겠다.
1984년. 그 당시 나는 대학에 낙방을 했고,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음악을 했다. 작은 분식점을 차려 낮에는 돈을 벌었고, 밤에는 무대를 찾아 다녔다. 그러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헤어 스타일리스트의 길을 걷게 됐다.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
분식점 서빙이 서툴러 깍두기를 쏟게 됐는데, 하필 그 손님이 미용협회 회장이었다. 나에게 대뜸 미용사가 될 생각이 없느냐고 묻기에 무조건 싫다고 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내 덩치가 작고(거울 안에 다 들어갈 정도로) 끼가 있어 보였다고 했다. 당시 미용실은 금남의 장소였다.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고 당연히 거절했다. 왜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블라우스 입고 이상한 목소리를 내는 남자 있지 않나. 딱 그런 이미지였으니까. 그 이후 그런 이미지와 차별화된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어서 마음을 굳히게 됐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쇼를 하고 싶었다. 그 당시엔 문화체육관이란 곳에서 패션쇼를 개최했다. 그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패션쇼란 걸 처음 봤고, 내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음악을 해서 그랬는지, 라이브한 무대가 나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저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다음부터 무작정 백스테이지 주변을 서성였다. 치한으로 몰려 가드들에게 멱살을 잡힌 일도 있었다.
1980년대의 패션쇼 백스테이지가 궁금하다.
지금이야 쇼에 맞게 헤어 메이크업 콘셉트를 정하고 전문 인력이 백스테이지에 투입된다지만, 그때는 모델들이 알아서 헤어 메이크업을 해결하고 오던 시절이다. 생각해보라. 누구는 업스타일 누구는 포니테일 모두 제각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무대에 올랐으니.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기억에 남는 모델이 있다면?
요즘 친구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이희재 씨와 현 동덕여대 모델학과 교수 김동수 씨이다. 이희재는 여왕이었다. 스태프들이 함부로 곁에 가지도 못했고, 그래서도 안 됐다.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모델은 김동수. 외국 생활을 하고 온 탓일까. 김동수는 무대 뒤에서도 친절했고 프로다웠다.
그렇게 척박한 상태에서 토대를 만들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
물론이다. 처음엔 고생을 많이 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보니까 백스테이지 환경을 바꾸고 싶어 사비를 털기 시작했다. 테이블보부터 시작해 스태프들 케이터링까지 환경을 개선하고 싶었다. 주변에서 손가락질하기도 했다. 왜 헤어 하는 사람이 패션쇼에 저리도 매달려 사는지, 이단아라고 비난도 많이 받았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살롱 운영이나 광고, 화보 촬영 등 다른 일만 해도 버거웠을 텐데. 사실 벌이도 비교도 안 되지 않나?
그냥 쇼가 좋았다. 지금도 그렇다. 어떤 때는 쇼 시작 5분 전에 헤어스타일을 바꿔야 할 때가 있다. 모델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공장처럼 머리를 만지기 시작한다. 한 명, 다음,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온몸이 땀범벅이 된다. 어린 스태프들은 한두 번 겪고 나서는 기겁을 하고 도망가기도 한다. 맞다. 개런티라는 것도 내가 요구해서 받아낸 게 10여 년 전이다. 그전까지는 제대로 받지도 못했다. 그런데, 난 그러면서도 눈부시게 치장한 모델이 멋지게 워킹하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머리카락이 쭈뼛 선다. 그 감정은 평생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다. 쇼는 마약이다. 매번 ‘아, 이번 시즌에는 딱 다섯 개만 해야지’ 하면서도 어김없이 20개의 백스테이지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 난 아직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 같다.

1. SFAA 컬렉션 이상봉 쇼 2. 한국 월드컵을 기념한 <보그> 패션 화보. 3. SFAA 컬렉션 박윤수 쇼. 4. 오민 개인 작업물 5. 로레알 프로페셔널 파리 팀과 함께한 헤어 화보. 6. 오민 개인 작업물. 7. 남자 모델 백명과 함께한 더블유의 화보. 8. SFAA 컬렉션 이상봉의 무대. 9. 모다 북 화보. 10. <보그> 패션 화보. 11. 모델 100명이 더블유의 로고 대형으로 서서 촬영했던 더블유 코리아 초기의 화보. 12. SFAA 컬렉션 박동준 쇼. 13. 디자이너 이상봉과 함께했던 화보.
한국 패션계를 현장에서 쭉 지켜봐온 증인이다. 패션계의 변화, 씁쓸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눈부신 속도로 여기까지 달려온 한국 패션계를 보면 감개무량하다. 모두의 노력으로 위상이 높아졌고, 규모도 어마어마해졌다. 씁쓸한 부분이 있다면 요구하고 요구해서 이뤄놓은 백스테이지 스태프들에 대한 처우, 개런티 등이 최근 매머드급 살롱들의 상업적인 홍보 활동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보상으로 일해주겠다며 들어오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오랜 시간 묵묵히 이곳을 지켜온 누군가는 자리를 내줘야 한다. 물론, 한두 시즌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겠지만….
지난 서울 컬렉션에서 봤다. 리허설 때마다 디자이너 옆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오민이 있더라.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디자이너 이상봉과 시안 미팅을 하는데 거의 여섯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디자이너들에게 차츰 ‘너 맘대로 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됐다. 그 말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어떤 때는 디자이너가 아직 옷을 덜 만들었다면서 스와치(샘플용 직물 조각)만 숍으로 보내올 때가 있다. 스와치만 보고 알아서 콘셉트를 정하라는 뜻이다. 또 디자이너 대신 모델 오디션을 보러 갈 때도 있고, 피팅에 관여하기도 한다. 헤어 스타일링은 단순히 헤어만 알아서 되는 일이 아니다. 패션을 알아야 하고, 그 디자이너의 고객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들의 소비 패턴, 사회의 흐름, 향후 6개월간의 트렌드 등등 모든 것을 아울러야 한다. 디자이너와 쇼 작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알게 됐다. 머리만 하는 사람이 아닌, 디자이너와 함께 쇼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한다.
패션 인더스트리, 특히 백스테이지에서는 일도 일이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 거 같다. 당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진심으로 대한다. 약속을 지킨다. 눈앞에 이익만 보고 계산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결국 누구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바보같이 굴더라도, 혹은 누군가에게 미움을 산다 해도 원칙대로 묵묵히 밀고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게 된다.
오늘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더블유 패션 에디터에게 궁금한 게 없느냐고 물어봤다. 전에 모델 100명 화보를 같이 작업한 최유경 에디터 말이다. 어떻게 체력 관리를 하시느냐, 꼭 물어봐달라고 하더라. 화보 촬영장에서 혼자만 지치지 않는다고 하던데.
원래 즐거운 일을 하면 잠이 안 온다. 쇼 할 때는 하루에 한 끼도 못 챙겨 먹을 때가 허다한데도 그냥 즐겁다.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게 또 행복하다. 그것뿐이다.
그러고 보니 모델 100명 화보처럼 블록버스터급 화보는 더블유가 전문이다. 그때마다 오민이 헤어 스태프로 참여했다.
사실 100명 화보의 시초는 지금 더블유 편집장으로 있는 이혜주 편집장이 <보그> 패션 에디터로 있던 시절 찍은 화보다. 처음에 모델 100명을 모아 찍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모델 100명이 섭외가 되었고, 밀레니엄을 앞둔 시점이어서 크게 화제가 되었다. 처음 아이디어를 같이 짠 포토그래퍼와의 촬영을 앞두고 여기저기 유명한 포토그래퍼들에게서 제안을 많이 받기도 했다. 용선이 형(현재 더블유 코리아의 하우스 스튜디오 fer studio 정용선 실장)도 함께하지 못해 너무 아쉬웠다. 옆에 와서 은근슬쩍 물어보고 그랬다. “100명 다 모았어?” 하하.
과연 슬럼프라는 게 있나? 당신에게도?
물론 있다. 특히 컬렉션이 끝나고 나면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기운이 빠진다.
어떻게 극복하나?
역시 여행이다. 많이 돌아다니고 나면, 회복된다. 100개국을 가보는 게 내 목표다.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일이 남아 있나?
물론이다. 멋진 헤어 스타일링과 패션에 관한 책을 출간하는 것, 그리고 미용 대학 설립이다. 총장이나 그런 거는 욕심 없고, 교수로 남고 싶다. 일을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일하고 싶다.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일하고 싶다. 두근두근 뛰는 심장을 느끼면서.
- 에디터
- 이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