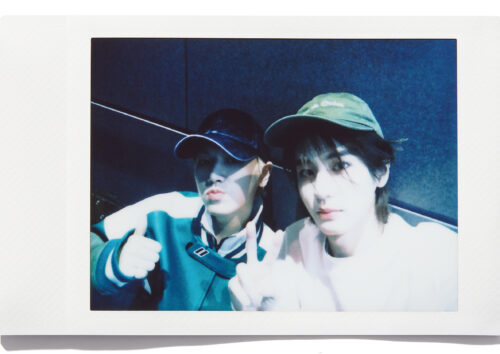찬 바람 불면 생각나는 생선들이 있다. 그것을 먹어야만 나의 가을은 시작된다.
전어 맛도 모르면서
서울 사람들은 이 썩은 걸 회라 먹나.” 어언 십수년 전의 일, 섬사람 부친이 서울로 진학해 자취하고 있는 딸에게 전어회를 사주다 젓가락을 놓고 타박한다. 전어에 기름이 오르는 걸로 긴 여름이 끝나는 줄 알고 살아온 우리 가족 입맛에 서울의 퍽퍽한 전어는 낯설었다. 이후 돈벌이를 시작한 딸이 대접을 한대도 부친은 고개를 젓는다. “수족관에서 억지로 목숨 붙여놓은 건 먹는 기 아이다.”
그런데 생선 맛에 유난을 떠는 나의 가족 말고도 전어가 맛있는 줄 모르겠다며 의아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제철 음식을 꿰고 챙기는 미식가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쏟아지는 기사나 광고, ‘깨가 서 말’이라는 식당 프로모션에 때를 놓칠세라 젓가락을 들었다가 실망하기 십상이다. 대도시에서 유통되는 전어의 대부분이 양식이며, 수조 탱크에서 부대끼며 먼 길을 오는 동안 성미 급한 전어는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기름이 쏙 빠져 ‘더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하던’ 명성을 구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름내 풍성한 플랑크톤과 유기물을 먹으며 가득 채워온 기름으로 기가 막히게 맛있다는 전설이 생겨났지만, 함부로 취급된 전어는 그 이미지만을 이어가고 있다.
제철 생선을 제철에 제대로 먹게 될 날이 얼마나 될까? “바다 지도가 바뀌었다”고 걱정하는 어민의 걱정이 괜한 호들갑은 아니다. 물론 모두가 바닷가에 살며 갓 잡은 제철 생선을 먹고 지낼 수는 없다. 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그 맛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된 데 오히려 감사함이 마땅할 테다. 하지만 적어도 차곡차곡 달이 차오르듯 맛을 모아온 가을의 전어는 무성의한 유통으로 함부로 훼손될 것이 아니다. 특히 탄식이 나올 만큼 더운 올해의 여름을 보내고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는 가을 전어의 첫맛은 좀 더 기름지고 풍성해야지 않을까. 그러려면 기가 막히게 맛있다는 전설이 만들어진 전어 본연의 모습이 어땠을지 따져보고 깐깐하게 골라 소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전어 축제가 열리는 현지에 찾아간다고 모두가 제맛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산 해운대 횟집에서 양식 광어를, 속초 관광수산시장까지 가서도 양식 광어를 먹고 오는 안타까운 여행객이 숱한 형편이니. 전어 축제 현장에서도 사이즈가 작은 냉동 양식 전어로 관광객을 대접하는 경우도 많다. 전어 맛도 모르고 ‘맛있다’고 하니 맛있나 보다 생각하고 자리에 앉은 손님에게는 그 편이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기억하자, 맛있는 자연산 전어는 15cm 정도 크기에 뾰족뾰족한 황금색 꼬리가 있다. 2년 이상 거친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온 생의 족적이다. 10월 중순이 넘어서면 뼈가 금세 굵어지니 짧디짧은 제철 전성기를 잘 노려야 한다. 믿을 수 있는 산지 식당이나 어촌계를 추천받아 방문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자연산 생선만 취급하는 여의도 식당 쿠마나 현지 어민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깐깐하게 구매하고 유통 과정까지 신경을 쓰는 인터넷 수산시장을 찾아보자. 인터넷 수산시장을 선택할 때는 자연산 전어의 모습이나 배송 요건에 대해 유난을 떨어둔 사이트를 찾는 것이 좋다. 관광 시장의 무성의함이 그대로 옮겨온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비린 맛의 생선은 으레 희석 소주로 씻어내듯 먹는 경우가 많지만 제맛이 오른 전어의 고소한 맛은 의외로 와인과 잘 어울린다. 특히 양식 전어보다 깊은 바다에서 거칠게 자란 전어가 맛있듯 ‘비개입주의’의 철학으로 만들어진 내추럴 와인의 맛은 다른 차원의 경험을 선사해줄 수 있다. 와인도 포도라는 농산물로 만들어진 술임을 생각해보았을 때, 풍부한 비료를 받으며 얕은 지층에 뿌리를 내린 포도나무와 거칠게 자라며 필요한 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땅속 깊은 곳까지 안간힘으로 뿌리를 내린 포도나무의 과실의 차이는 상상하기 쉽다. 정제나 여과를 하지 않은 내추럴 와인은 일반적인 와인에서 경험하기 쉽지 않은 와인 본연의 감칠맛을 지닌 경우가 많다. 그중에서도 프랑스 쥐라(Jura) 지역 와인은 즉각적인 과일 향보다는 풍부한 미네랄 맛과 산화 숙성 과정에서 더해진 고소한 견과류의 풍미, 자연스러운 산미가 전어의 고소한 맛을 살리면서도 자칫 비리게 느껴질 수 있는 기름진 맛을 잘 보완해준다. 가을 수확의 기쁨은 반주와 함께 배가된다. 글 | 김은지(툭툭누들타이 이사)
꽁치의 간을 찾아서
옛날 도쿄에서 아내도 잡히고 먹었다는 생선이 있다. 참치? 천만의 말씀. 당시 참치는 사무라이가 먹기엔 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몰래 숨어 먹었다. 정답은 뜻밖에도 가다랑어다. 물론 요즘 가다랑어와 참치는 비교할 수 없는 가격이다. 가다랑어는 한 마리에 5천원에도 살 수 있다. 참치는 늘 금값이다. 그래도 여전히 일본에서 맏물 가다랑어는 인기 있는 생선이다. 일본인은 맏물 (初物)에 전전긍긍한다. 계절 요리(旬彩)가 일식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미식가와 일류 이타마에(板前 요리사)는 계절 요리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다. 24절기마다 무얼 먹고, 무엇이 나오는지 꿰고 있다. 문득 여름의 끝, 맏물로 먹을 생선을 생각하다 보니 꽁치가 떠올랐다. 마침 간사이 지방의 남쪽 작은 도시 와카야마에서 오사카로 거슬러 오는 여정이었다. 무얼 먹을까. 맏물 꽁치가 나왔을까. 아직 8월 말은 이른데…. 와카야마의 길거리 이자카야 문에 큼지막한 붓글씨 안내가 보인다. “初物 さんま 刺身”. 이런! 얼른 한 접시 주문한다. 이런 생선은 보이자마자 주문해놓아야 한다. 맏물은 인기가 좋다. 그것도 회로 판다니 한정된 수량일 가능성이 높다. 꽁치 회라. 등 푸른 것을 회로 먹는다면 아주 운이 좋다. 금세 부패하니까. 아직 기름이 덜 올랐다. 게다가 크기도 작다. 반짝이는 은빛 뱃구레가 보이고, 등은 푸르다. 잔가시를 손질해서 부드럽게 씹힌다. 서너 시간만 지나면 이건 횟감에서 구이로 넘어가야 할 판이다. 달콤하다. 살의 단맛과 서로 상치되는 게 내장이다. 따로 내장을 내주는데, 이건 날것이 아니라 익히거나 소금을 쳐서 살짝 숙성시킨다. 모든 움직이는 것들의 내장은 맛있게 마련이지만, 꽁치 내장은 각별하다. 씁쓸한 것이 입맛을 돋운다. 박하 향처럼 자극적으로 톡 쏘는 맛이 혀끝에 남고 꽁치 간의 자욱한 농밀함이 혀를 채운다.
꽁치는 빠른 속도로 회유하면서 먹이를 먹어 치우고 자란다. 멀리 중국해에서 올라와 우리 동해와 한일 사이의 바다를 유영하며 살을 찌운다. 우리가 먹는 꽁치의 다수가 냉동 타이완산인 경우가 많은데, 아직 북상하지도 않은 꽁치를 그쪽 바다에서 미리 잡아버린다는 얘기도 있다. 그걸 우리가 사 먹는다. 횟집의 싸구려 ‘츠케다시’로 전락한 꽁치의 정체가 그것이다.
포장마차는 늦가을부터 겨울이 제격이었다. 손님들이 ‘어 춥다’ 하며 손을 비비거나 코트 깃을 세우고 포장 천을 들추고 들어서야 분위기가 살았다. 여름 포장마차는 최악이다. 우선 해산물 재료가 좋은 게 드물고 오뎅 같은 국물을 훌훌 들이마시는 서정이 없는 까닭이다. 냉장고도 없이 얼음이나 한 장 깔고 재료를 파는 셈이니 선도를 기대하는 게 무리다. 늦가을 포장마차는 두 가지 연기로 손님을 꼬였다. 양념 바른 곰장어와 꽁치. 그때도 꽁치는 무지하게 쌌다. 아마도 한 짝 스무 마리에 지금 돈으로 5천원이면 장만했으리라. 동해에서 꽁치가 많이 잡히면 쓸모가 없어서 비료로 팔았다고 하니. 하긴, 스코틀랜드에서는 그 옛날 로브스터가 많이 잡혀서 역시 비료로 썼다니까. 뭐든 희소해지면 귀해지고 값이 오른다. 지금 물 좋은 생물 꽁치는 금값이다. 노량진의 노련한 상인에게 주문해도 고개를 젓는다. 물건이 안 들어온다는 뜻이다. 부자만 먹었던 광어는 발에 채는데….
꽁치는 석쇠에 연탄 화덕으로 구워야 제맛이다. ‘제격’이라고 할 것이라면 숯을 써야겠지만 본 적이 없다. 포장마차에서는 그저 연탄이었다. 푸른 연기가 버스들이 다니는 큰길을 배경으로 피어올랐다. 먼저 내장을 발라내어(운이 좋으면 알이 걸릴 수도 있다. 이건 진미 중의 진미다) 소금 없이 먹는다. 그 맛은 앞에 쓴 바와 같다. 갈색을 띠는 등살을 먹는다. 피를 많이 머금은 부위라 진하다. 그다음엔 기름기가 도는 노오란 뱃살을 씹는다. 천천히 기름기가 퍼져 나간다. 찬 소주를 한 잔 부어서 비린내를 씻어낸다. 이제 포장마차는 없다. 있더라도 관광상품이 되어버리거나 꽁치를 제대로 구울 준비가 되어 있는 집은 거의 없다. 횟집에서 공짜 안주가 되어버린 꽁치를 누가 돈 주고 사 먹을까. 혹시 일본에 가면 동네 사람들에게 명망 있는 이자카야를 슬슬 돌아보라. “꽁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지금쯤에는 틀림없이 파는 집이 있을 테니. 글 | 박찬일(로칸다 몽로 셰프)
최신기사
- 피쳐 에디터
- 김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