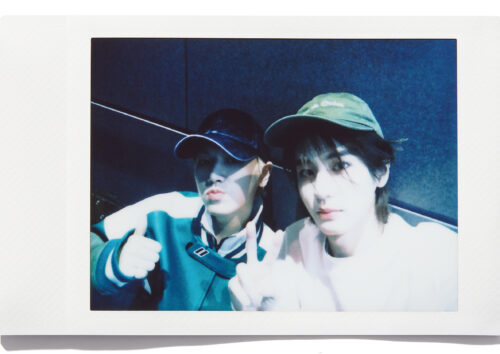젊은 설치 미술가 김민애는 미술을 정의하는 세간의 통념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한다. 이번엔 아뜰리에 에르메스에서 열리는 <기러기 GIROGI>전을 통해 물음표를 던졌다.

강남 도산공원 근처에 있는 에르메스 플래그십 스토어, 건물 지하의 아담한 카페 ‘마당’을 지나 갤러리인 ‘아뜰리에 에르메스’로 들어선다. 전시장의 어둠 속에서도 벽면을 메운 거대한 새들의 형상이 두 눈에 선명히 보인다. 작년 여름 바로 이곳에서 열린 그룹전 <오 친구들이여, 친구는 없구나> 전에 참여한 설치 작가 김민애의 개인전이 열리는 현장이다. 줄지어 걸어가는 듯한 각종 새 아홉 마리는 <기러기 GIROGI>라는 제목으로 엄연히 전시 중인 부조 작품들. 여기에 히치콕의 영화 <새>에서처럼 푸드덕거리는 새의 날갯짓 소리가 울려 퍼지고, 천장에 매달린 조명은 천천히 움직이며 새를 하나씩 비춘다. 다소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에 관람객은 잠시 당황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새’는 미술이라는 개념에 질문을 던지는 작가가 가짜로 내세운 주인공이다. 히치콕의 영화에 중요한 듯 보이나 실은 속임수 장치인 맥거핀이 있는 것처럼. 전시장이란 미술을 담는 공간이지만, 거꾸로 그 안에 들어온 것을 미술이라고 규정해주기도 한다. <기러기 GIROGI> 전은 그런 관습을 화두로 삼은 설치 전시다. 아뜰리에 에르메스에서 3월 16일에 시작한 전시는 5월 13일까지 이어진다.
<W korea> 지금까지 주로 어떤 작업을 해왔나?
김민애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내가 반응하는 식의 작업을 많이 했다. 내 임의로 바꿀 수가 없는 건축 공간의 구조나 규격, 컬러 등을 그대로 활용하며 설치물을 만드는 거다. 나라는 존재를 최대한 지우고, 이미 주어진 객관적인 요소를 이용해 미술을 해도 과연 미술이 될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렇게 시도한 설치 작업을 하나 소개해준다면?
2014년 리움에서 열린 <아트스펙트럼> 전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 답사를 했을 때, 중견 사진가 히로시 스키모토의 전시가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건축가 렘 콜하스가 설계한 전시장의 탈근대적 분위기를 지워버리고 싶었는지, 전시장 내부의 공간에 모두 하얀 가벽이 둘러진 상태였다. 위 블랙박스 공간을 지탱하는 기둥마저도 가벽으로 가려져 있고. 두 거장의 욕망이 충돌하는 모습으로 여겨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나만의 욕망을 그 사이에 끼워넣어보자는 우스꽝스러운 생각으로 사진가의 가벽을 떼어다가 <세 작가>라는 작업을 진행했다. 우주선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의 에스컬레이터 앞 카펫이 한없이 연장되는 듯, 벽을 타고 작업을 넘어 천장까지 이어지게 부착했다. 또 건물의 부가적 요소였던 통로 아랫면의 형태를 그대로 복제하여 LED 조명과 함께 벽면에 설치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것을 그럴싸한 미니멀 조각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했다. 미술관에 있던 기존의 물리적 요소와 맥락을 작업에 활용한 셈이다.
미술 작가로서 어떤 화두를 품고 있기에 그런 작업을 하는가?
현대 미술사에서 뒤샹으로부터 출발한 오래된 질문이기도 한데, 미술을 누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관심이 많다. 영국 왕립예술대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더욱 그런 의문을 품었다. 흔히 작가라고 하면 아주 창의적인 존재일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나 역시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며 지극히 학습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미술인이 창작을 한다는 건 관념일 뿐, 나를 규정짓는 것들이 다 외부에서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어떤 작업이나 설치물이 전시장이라고 규정된 공간에 자리하면 저절로 미술이 돼버리는 거다. 그런 현상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
그래서, 여러 실험을 통해 미술이 뭔지에 대한 답에 좀 더 다가갔나?
또 사연이 있다(웃음). 주어진 환경에 맞춰 놀이하듯 미술을 하다 보니, ‘나’라는 존재를 지울 수는 있었지만 작업이 다소 건조한 거다. 내가 쓸 수 있는 요소가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한번은 역시 물리적인 공간을 활용한 설치 작업을 하다가 좀 답답해 보여서 즉흥적으로 커다란 검정, 분홍 공을 구해 전시 공간에 막 흩트려놨다. 그런데 그 의미 없는 공들이 의외의 역할을 했다. 시각적인 즐거움도 주면서 알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달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즉각적인 감정을 불러내는 그런 비논리적인 것이야말로 미술이 아닐까 싶었다.

이번 전시의 주인공으로 새를 택한 이유도 그와 관련이 있나?
세 살 된 아이가 동물원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동화책을 통해 이미 동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는 걸 발견했다. 내 경우 어릴 때 진짜 토끼를 처음 보고 징그러워서 당황한 기억이 있다. 내가 알던 동화책 속의 토끼는 귀엽게 단순화된 모습이었는데 말이다. 이렇게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내가 아닌 세상의 규정에 따라 모든 걸 학습한다. 지난겨울 패딩이 유행한 탓에 캐나다 구스도 어쩐지 익숙하다. 거위털과 오리털을 비교 분석하는 블로그 글도 넘쳐나더라. 하나의 전시를 구성하기 위한 미술적 배경이나 논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이번 전시를 만들어보고자 했다. 참새부터 백조에 이르는 새들은 별 논리가 없이 등장한 감정의 덩어리들이다. 그것들을 전시장이라고 규정된 공간 안에 들이민 것이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보이는 게 새들뿐인데, 그 새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니 허무하다(웃음).
천장에서 돌아가는 조명이 벽을 비추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부분은 오히려 새의 형상이 안 보일 정도로 새하얀 상태가 된다. 관람객이 발 딛고 선 곳은 전시장이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실체가 없는 셈이다. 새 부조 역시 구글에 ‘닭 그리는 법’ 같은 문장을 검색하여 아주 단순화된 일러스트를 가지고 만들었다. 우리는 이것이 새라고 알아보지만, 아이들 동물 책의 일러스트처럼 진짜 새 이미지는 아닌 것이다.
가짜 주인공이어도 일단 주인공이니, 전시장 벽면을 채운 새에 대해 설명해달라.
3미터 높이의 새들이 박제된 듯이 꽉 차게 들어서 있다. 참새, 비둘기, 갈매기, 닭, 오리, 청둥오리, 거위, 캐나다 구스, 백조 등 총 아홉 개의 부조다. 전시 제목은 <기러기 GIROGI>이지만 여기에 기러기는 없다(웃음). 새가 가짜 주인공인 상태를 은유하려니 제목도 그렇게 지었다. 부조 작품들은 고무 소재로 만들었다.
한 미술인의 내적 갈등과 물음표 가득한 뇌 속을 들여다본 기분이다. 전시장을 찾을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
전시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나도 상당히 궁금하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화려한 매장 안으로 들어왔더니, 이렇게 공허한 전시장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미술인인 나는 그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최신기사
- 피처 에디터
- 권은경
- 포토그래퍼
- 박종원